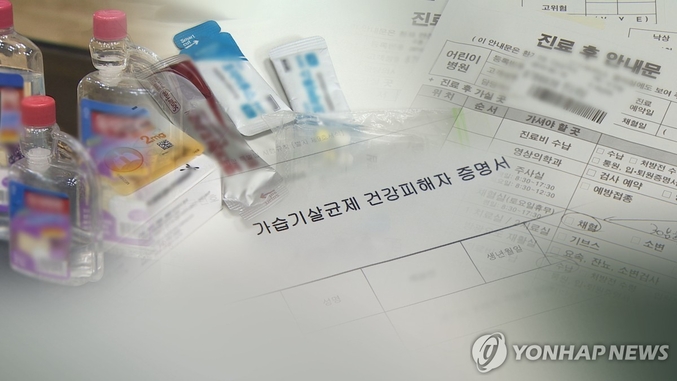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6일 항소심 재판에서 뒤집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이 재판은 2014년 첫 시작됐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돼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그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이라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환경부 장관 등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다음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화학물질이 심사 용도 외로 사용되거나 최종제품에 다량 첨가되는 경우에 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물질 자체의 독성 등 유해성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심사·평가된 것도 아니었음에도 일반화해 공표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용도와 사용 방법에 관한 아무런 제한 없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표하는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불충분한 심사와 고시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은 국민의 건강·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직접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역학조사 미실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의약외품 미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1심처럼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5명 중 2명은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 액수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이미 받은 지원금, 구제급여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돼왔다.
2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잡고 재판까지 열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이날로 2주 연기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송기호 변호사는 선고 후 "국가가 단순히 피해자들을 시혜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배상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큰 판결"이라며 "국가는 이 판결에 상고하지 말고 피해자 배상을 최종적으로 국가의 법적 의무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